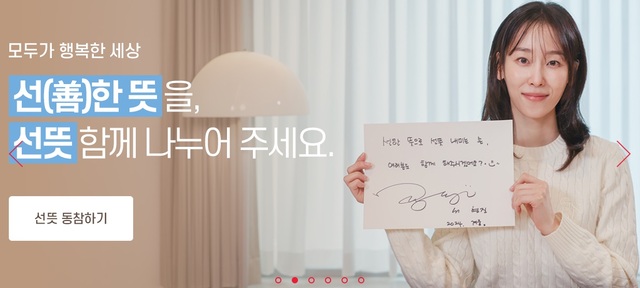나는 89학번이다. 무개념 무의식.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대학 문턱을 넘었다. 그때 그 시절, 세상은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왜 시끄러운지 나에게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은 없었다. 게스 멜빵 바지를 입고 톰보이 가방을 메고 커다랗고 동그란 안경테를 쓰고는 만화책에 나오는 얼빵하고 순진한 아이처럼 나풀나풀 돌아다녔다. 그러던 어느날, 우연찮게 가투(가두 투쟁)현장에 휩쓸려 아주 죽을 뻔한 적이 있다. 최루탄이 터지고 길가에 깨진 보도블록이 나뒹굴고 있었으며 숨도 못 쉴 만큼 지옥 같은 그곳에서 백골단이 학생들을 질질 끌고 가고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아 두들겨 패고 있는 걸 봤다. 그 순간 나는, 이유가 있든 없든 무조건 도망쳐야 했다. 나는 미친 듯이 도망가다 좁은 골목길에 숨었고 골목 입구에는 주인 잃은 신발들이 나뒹굴고 있었다. 숨을 죽이고 흐느껴 울면서 머리카락이 보이지 않도록 꼭꼭 숨어야 했다. 그런데 그날, 여학생 한 명이 죽었다. 이름은 김귀정, 성균관대 학생이었다. 백골단의 토끼몰이식 과잉 진압 작전에 떠밀려 압사당했다고 했다. 그때 내가 본 수많은 주인 잃은 신발 중에 그녀의 신발도 나뒹굴고 있었을지 모른다. 사실 나는 치열하게 살지 못했다. 두들겨 맞지도, 어디로 끌려가 보지도 않았다. 안전한 금밖에 서서 구경하는 쪽에 더 가까웠다. 의식이 있는 척 흉내라도 내보려 했으나 그건 말 그대로 가식일 뿐이었다.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며 분노를 삼켜본 적도 없다. 며칠 전에 벌어진 ‘계엄 해프닝’으로 우리 가족 모두 밤잠을 설쳤다. 서울로 직장에 다니는 아들은 새벽 6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해야 하지만 밤새 잠을 설쳐서인지 몇 번이나 깨웠는데도 일어나지 못했다. 알람 소리가 5분 간격으로 시끄럽게 울려대는데도 꼼짝하지 않고 누워만 있었다. 어떻게 해야 눈을 번쩍 뜨게 할까, 고민하다 아이 귀에 대고 이렇게 말해 주었다. "내일이 월급날이야. 힘내자!“ 그제야 아들은 무거운 몸을 일으켜 씻으러 들어갔다. 아무리 일하는 게 힘들고 고달프다 해도 월급날 내 통장에 들어오는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다시 한 달을 버티며 살아낸다. 아침마다 고단한 몸을 일으켜 버스와 지하철에 몸을 싣는 사람들이 뭐 대단한 걸 바랄까. 자식들이, 가족이, 별 탈 없이 안전한 나라에서 살아가길 바랄 뿐이다. 그런 기본적인 것조차 보장해 주지 못하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인가.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 애쓰며 사는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나. 거리 곳곳에 폐업하는 가게들이 늘어나고 일을 해도 내 손에 돈이 안 들어와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국민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거리엔 주인 잃은 신발이 나뒹굴지도, 지랄탄이 터지지도, 백골단이 토끼몰이하며 학생들을 두들겨 패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살기 좋은 세상이 온 것 같지도 않다. 살아있다면 쉰 후반의 나이가 되어 나처럼 평범한 일상을 살아내고 있을 언니. 하지만 그녀는 아직도 스물네 살 꽃띠다. 그 시절, 전투경찰들이 쏜 지랄탄에 눈물 콧물 흘려가며 부당한 세상에 맞섰던 젊은이들은 어느새 중년의 나이가 훌쩍 넘어버렸다. 누군가는 죽고 또 누군가는 살아남았지만, 아직도 그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고 믿고 싶다. 글 _ 김양미 비비안나(소설가)
2024-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