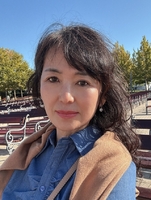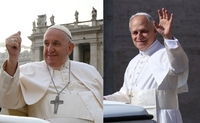모든 사회에는 주류 사회와는 다른 공동체 생활을 추구하면서 역설적으로 그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남녀 집단이 존재해 왔다. 이들은 서구 그리스도교에서는 ‘수도회’로, 인도의 힌두교나 불교에서는 ‘삿상’(satsangh)이나 ‘판스’(panth)로 알려져 있다.
어느 쪽이든 이들은 주류 사회와 대조되거나 대안적인 삶을 제공하기 때문에 ‘대조 공동체’(contrast communities)라고 불린다. 이들은 강한 종교적 영감을 삶 속에서 공개적으로 실천하는 사람들로 ‘축성된(consecrated) 사람들’이다.
역사적으로 주류 사회의 목표가 안정과 확장을 추구하는 것이었다면, 종교 공동체의 목표는 전혀 달랐다.
우선, 종교 공동체는 보통 규모가 매우 작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닌 가치와 영감을 실행하는 방식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의 토양이 되며 놀라운 매력을 발산한다. 서구 유럽의 ‘축복받은 자’ 베네딕토와 인도의 ‘깨달은 자’ 고타마 붓다가 그 예이다.
주류 사회는 가족을 중심으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부의 축적을 통해 그 위치를 강화한다. 또한 경제적 또는 정치적 지배를 통해 다른 작은 공동체를 흡수하거나 ‘참조 집단’(reference group)으로 자리 잡아 문화적 가치를 확산시킨다.

반면 종교 공동체는 다르다. 안정의 기반인 가족은 종교 생활에서 중요 가치가 아니다. 수도원에서는 자녀가 없으며 남성과 여성은 결혼하지 않고 독신 생활을 한다. 소유를 기반으로 한 확장성도 가치가 떨어진다. 이들은 의도적으로 검소하고 절제된 삶을 살거나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한다. 라틴어 ‘proprietas’(소유)는 ‘communitas’(공동체)로 대체된다.
사회학자들은 ‘공동체’를 세 가지 의미로 본다. 첫째, 특정 지역이나 장소로서의 공동체이며, 둘째, 그 지역 내의 사회적 관계망으로서의 공동체, 셋째, 소속감이나 ‘친교’(communion)를 느끼는 관계로서의 공동체이다. 종교 공동체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세 가지 의미가 모두 발견된다.
오늘날 종교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앞서 언급한 핵심은 종교 공동체가 주류 사회와 대조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들의 생활 방식은 소비 사회의 가치에 갇혀 있거나 전체주의 국가의 억압에 숨 막히는 사람들에게 대안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종교인들은 사회의 경계에 서 있는 ‘주변적’ 인물들이다. (물론, 예술가, 범죄자, 만성 질환자 등도 이 자리를 차지하지만 종교인들은 그들과 달리 동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종교인들은 카스트, 인종, 성별, 경제적 이유로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더 큰 공감을 제공한다. 현대 사회에서 인간의 권리를 위한 이러한 투쟁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의미를 제공한다.
예언(Prophecy)이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의미에서 누군가를 대신해 목소리를 내는 것을 의미한다. 종교 공동체는 본질적으로 친(親) 체제적이기보다는 반체제적이며 도발적이다. 해방신학자 존 소브리노(Jon Sobrino)가 이를 “예수라는 사람의 위험한 기억을 되살리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다시 말해, 축성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대로 그들의 제자직 소명을 실천하며 “세상의 소금이 되고 언덕 위의 등불”이 된다.(마태 5,13-16 참조)
오랫동안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종교적 소명의 일부였다. 하지만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 단순한 돌봄을 넘어 그들에 대한 존중과 배우려는 자세가 더해졌다. 이후 ‘가난한 이들에 대한 선택적 우선’(option for the poor)은 많은 종교 공동체에서 놀라운 결과를 낳아 왔다.
이 결과가 마더 테레사의 사랑처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든, 해방신학의 영향으로 생겨난 수많은 ‘작은 공동체’에서 더 조용하게 나타났든 변화는 분명히 있었다. 이러한 ‘가난한 이들을 위한 선택’은 많은 종교 단체가 소비문화의 물질적 쾌락주의를 거부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단순하게 살길 바라고, 다른 사람들도 단순히 살기’를 원한다.
이러한 작은 공동체가 더 큰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믿는다. 그 영향력은 숫자의 크기가 아니라 비전의 명확성, 동기의 강도, 그리고 실행의 에너지에 비례한다고 본다.
종교 생활의 한 형태가 사라지면 또 다른 생동적이고 강력한 형태가 그 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부활의 힘’이라고 부른다. 축성생활은 인간 사회에서 역동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글 _ 미론 페레이라 신부
예수회 사제로 평생을 기자 양성 등 언론활동에 힘써 왔다. 인도 하비에르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을 지냈으며, 아시아가톨릭뉴스(UCAN), 라 크루아(La Croix) 등 다양한 매체에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